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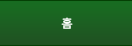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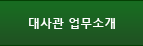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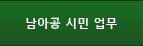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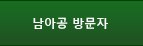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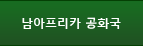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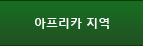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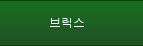 |
 |

| 남아공과 한국전 (1950-1953) |
|
||
|
||
한국전은 1950 년 6 월 25 일 북한군이 38 선을 넘어 남한을 침입해 일어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즉각적 전투종료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 이후 무장공격 격퇴와 국제평화, 한국의 안보 회복을 위해 유엔회원국은 대한민국 지원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했다.
유엔의 창립 회원국으로 남아공 정부는 1950 년 8 월 4 일 유엔지휘하에 남아공 공군 전투단과 지상병력을 배치하여 유엔의 결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당시 남아공 군대는 남아공내의 복무에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파병 병력은 자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50 년 9 월 26 일 ‘ 날으는 치타’ 라고 불리는 남아공 제2 전투비행단소속 장교 49 명과 기타 직급 206 명은 더반을 출발 일본 요코하마를 경유해 한국으로 배치되었다. 미공군 제18 전폭기 편대의 일원인 남아공 제2 전투중대의 역할은F51D 무스탕 전투기과 F-86F 세이버 전투기를 이용해 공대지 공격과 고공 차단을 하는 것이었다.
1953 년 7 월 27 일 판문점 휴전협정 서명으로 마무리된 전쟁에서 제2 전투비행단은 12,067 번 출격하는 동안 97 개 무스탕 전투기중 74 개를 잃었고 22 개의 세이버 전투기중 4 개를 잃었다.
UN 한국참전국 협회에 의하면 총 826 명의 남아공 군인이 한국전에 참전했다. 243 명의 공군 장교를 비롯하여 545 명의 지상병력이 한국전에서 활약하였으며 38 명의 육군 장교 및 사병은 영연방 제1 사단으로 참가하였다. 37 명의 남아공인이 한국전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쳤고 이중 11 명의 유해가 부산 UN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전쟁후 남아공은 유엔군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16 개 유엔군 사령부 파병국’의 일원으로 유엔군 사령부, 유엔군사령부 휴전위원회, UN기념공원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남아공의 이런 회원자격은 정지되었다.
2010 년 남아공의 유엔군사령부 회원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그 이후 주한 남아공대사관은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